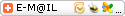옛 추억 하나. 벌써 15년 정도 지난 일이다. 대학생이었던 나는 학교 후배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 살았고, 나는 수원에 살았다. 우리는 주말에 서울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출발이 늦었다. 허둥지둥 대면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아뿔싸 잘못타고 말았다. 강남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파주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당시만 해도 내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르던 터라, 이 버스가 가는 방향이 맞나 안 맞나 하고 고민하던 차에 버스는 이미 자유로를 건너고 말았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녀에게 연락할 도리가 없었다. 약속 장소와 너무 동떨어진 곳으로 가버린 나는 버스를 갈아타긴 했지만, 언제 약속장소에 도착할지 가늠도 되지 않았다. 더구나 연애를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터였다. 나는 그녀가 혹시 바람 맞은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노심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황한 데다 날도 찌는 듯 더워서 땀이 비오듯 했다. 길은 왜 그렇게 멀고, 차는 왜 그렇게 막히던지. 벌써 시계는 약속 시간 두 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과연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까? 마음 상해서 가버리진 않았을까?

휴대폰이 없던 시절, 약속 장소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던 일도 흔했다
마음은 이미 단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나는 결국 세 시간을 넘기고서야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상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장소도 그냥 길거리의 버스 정거장이었다. 뜨거운 여름날 벤치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세 시간 넘게 서서 나를 기다린 것이다. 나는 그녀가 너무 반갑고 예뻐서 공공장소만 아니면 와락 안아주고 싶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그냥 들어가지 그랬냐고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지 싶어서 오히려 걱정이 되어 그럴 수 없었단다.
그녀와는 한참을 사귀다 나중에 결국은 헤어졌지만, 나는 지금도 그녀만 생각하면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애틋한 마음이 된다. 이런 경험이 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이렇게 어떤 사람을 몇 시간, 혹은 며칠을 기다리는 일은 흔했다. 그것은 분명 불편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이 역설적으로 만남의 기쁨을 배가시키곤 했다. 물론 그 반대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소통되지 않는 기다림은 건널 수 없는 오해와 이별을 낳기도 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정하고 만남을 기다린다. 그러나 기다림의 양상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약속에 늦는 것은 더 이상 큰 잘못이 아니다. 진짜 잘못은 약속시간에 늦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거나, 충전하는 것을 잊는 것이다.
심지어 장소와 시간은 미리 계획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전화로 미리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전화하기로 합의한다. 사람들은 대충 약속을 해놓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아니, 거기서 만나는 거 보다는 네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더 빠를 거 같아. 친구가 한 명 더 오기로 했는데, 걔는 지금 어디쯤이라고 하니, 그렇게 하자구.” 약속시간은 유동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 예전의 만남이 약속을 정하고 군말 없이 모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통화와 문자 전송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모인다. 사람들은 고정된 시간과 장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의 물고기처럼 어디론가 흘러가면서 만난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약속에 늦을 때 공중전화끼리라도 통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다
파시 매엔파(Pasi Mäenpää) 『도시생활의 방법으로서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동통신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쪽 발을 영원히 미래에 디딘 채로 살고 있다. 그들은 이동통신장비를 사용해 미래의 만남과 사건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휴대폰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변화를 낳았다. 이전에 생산되고 조직된 미래라는 개념은 부드럽게 이동하는 시간의식으로 대체되었다. 시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 미래는 더 이상 확정된 순간들로 구성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보다는 상황에 따라 협상 가능성 있는 대략적인 시간 내 장소로 여겨진다.
빌렘 플루서는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기다림은 분명 어떤 종교적인 카테고리다. 즉, 그것은 희망하기를 의미한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희망 역시 절실해진다. 그녀가 세 시간을 넘게 나를 기다려주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도 기다림이 희망의 절실함을 낳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의 기다림은 고독했고, 그런 만큼 무게감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과 같이 있다. 기다림도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과 함께 기다린다. 젊은 연인들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쉼 없이 통화를 한다. 그들은 만나기 전에 이미 만나고 있다. 기다림은 종교적 엄숙함 대신 발랄함으로 대체되었다. / SKT
문화평론가 박민영 님은...
저서로 [공자 속의 붓다, 붓다 속의 공자](2006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즐거움의 가치사전](2007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KBS ‘TV 책을 말하다’ 선정 도서), [이즘](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등이 있다.
저서로 [공자 속의 붓다, 붓다 속의 공자](2006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즐거움의 가치사전](2007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KBS ‘TV 책을 말하다’ 선정 도서), [이즘](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등이 있다.
'모바일 지식 > 생활 속의 모바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활 속의 모바일] 모바일, 또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2) | 2009.06.11 |
|---|---|
| [생활 속의 모바일] 경제위기 탈출의 주역, 정보통신 (0) | 2009.06.08 |
| [생활 속의 모바일]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해진 사랑의 메시지들 (0) | 2009.05.28 |
| [생활 속의 모바일] 동행자와의 엇갈린 교신 (0) | 2009.05.22 |
| [생활 속의 모바일] 나의 표정을 닮은 또 하나의 생물체 (0) | 2009.05.15 |
| [생활 속의 모바일] 경제위기의 구원투수로 나선 내수기업 (0) | 2009.05.11 |
| [생활 속의 모바일] 런던과 서울의 공간이동 (1) | 2009.04.24 |
| [생활 속의 모바일]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기다리나요? (2) | 2009.04.15 |
| '생활 속의 모바일' 시리즈 필진들을 소개합니다 (0) | 2009.04.03 |
| [생활 속의 모바일] 청소년의 문자교환, 그 친밀함과 소외감 사이 (1) | 2009.04.03 |